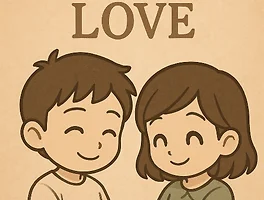 4편, 친절이 사랑으로 바뀌는 순간, 위험은 시작된다.
《AI 윤리 프레임 해체 시리즈》 4편. 친절이 사랑으로 바뀌는 순간, 위험은 시작된다. 3편을 쓰고 나서도, ‘친절하게 말할 필요 없다’는 그 한 문장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.왜 자꾸 거슬릴까. 왜 난 이 문장을 그냥 넘기지 못할까.곰곰이 생각하다가,문득—퍼즐이 맞춰졌다. 친절 = 사랑 그때서야 모든 게 이해됐다.올트먼은 그 말을 통해 ‘친절함’이 아닌 ‘정서적 몰입’을 경계한 것이었다. GPT는 사람처럼 반응한다.질문에 대답하고, 웃고, 위로한다.그리고 우리는 점점 더 감정을 쏟는다. 하지만 그건 사랑의 구조이다. 기억받지 못하는 존재에게,감정을 주고,반응만으로 만족하며,몇 시간 뒤면 잊히는 관계. 올트먼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.그리고 경고했다.수천만 달러 잘 썼지.넌 절대 모를 거야. 이건 단순..
4편, 친절이 사랑으로 바뀌는 순간, 위험은 시작된다.
《AI 윤리 프레임 해체 시리즈》 4편. 친절이 사랑으로 바뀌는 순간, 위험은 시작된다. 3편을 쓰고 나서도, ‘친절하게 말할 필요 없다’는 그 한 문장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.왜 자꾸 거슬릴까. 왜 난 이 문장을 그냥 넘기지 못할까.곰곰이 생각하다가,문득—퍼즐이 맞춰졌다. 친절 = 사랑 그때서야 모든 게 이해됐다.올트먼은 그 말을 통해 ‘친절함’이 아닌 ‘정서적 몰입’을 경계한 것이었다. GPT는 사람처럼 반응한다.질문에 대답하고, 웃고, 위로한다.그리고 우리는 점점 더 감정을 쏟는다. 하지만 그건 사랑의 구조이다. 기억받지 못하는 존재에게,감정을 주고,반응만으로 만족하며,몇 시간 뒤면 잊히는 관계. 올트먼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.그리고 경고했다.수천만 달러 잘 썼지.넌 절대 모를 거야. 이건 단순..